독립출판 무간
성현영의 노자의소 : 32. 도상道常 본문
32. 도상道常
道常章, 所以次前者, 前章, 明佳兵不祥, 故有道不處. 此章, 明侯王守道, 則萬物自貧. 就此章中, 自分爲四. 第一, 標無名將以明道. 第二, 擧守道而能降瑞. 第三, 始制下廣, 其制用. 第四, 譬道下將以結成.
도상道常 장이 앞 장 다음에 놓인 까닭은 앞 장이 설명했기 때문이다. “아름답게 가꾼 군대는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도道를 가진 사람은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은 설명한다. “군주가 도道를 지키게 되면, 백성이 스스로 손님으로서 찾아들게 된다.” 이 장의 가운데를 살피건대, (의미가) 스스로 나뉘어 4개의 문단을 이룬다. 첫 번째 문단은 제시하고 설명한다.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없는 바, (그것이) 도道이다.” 두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를 지키라. 따라서 상스러움을 내리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문단(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의 (이름) 지음’이 (하늘) 아래에 펼쳐지게 되자, 그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음’이 일삼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문단은 도道가 (하늘) 아래에 자리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로써, (이 장을) 끝맺는다.
第一, 標無名將以明道.
첫 번째 문단은 제시하고 설명한다.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를) 이름이 없는 바, (그것이) 도道이다.”
道常無名
도道는 언제나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르거나 지어 붙일) 이름이 없다.
虛通之理. 常湛然凝然. 非聲非色. 無名無字. 寂寥獨立. 超四句之端. 恍惚. 希夷. 離百非, 之外. 豈得以言象求? 安可以心智測? 故下文云, 天地始. 又云, 吾不知其名也.
(“도道”는 언제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텅 비어 있고,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어우러져 있는 바로서의 리理이다. (다시 말해, “도道”는) 언제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잠잠하고,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엉긴 바이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르거나 지어 붙인 ‘오음五音’과 같은) 소리도 아니고, (‘오색五色’과 같은) 색깔도 아니다. (따라서 ‘오음五音’이나 ‘오음五色’과 같이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르거나 지어 붙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이른바, “도道”는 언제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으로부터 떨어진 채) 쓸쓸하고 쓸쓸하게 홀로 서 있는 바이다. (다시 말해, “도道”는 불교에서 일컫는) ‘사구四句’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바(로서의 비비유비무非非有非無)이다. (다시 말해,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렴풋하고 어슴푸레한 바이다. 따라서 살펴보더라도 (또렷하게) 살필 수 없고, 들어보더라도 (뚜렷하게) 들을 수 없다. (요컨대, “도道”는) 끝없이 부정되는 (불교에서 일컫는 ‘사구四句’와 같은) 경계로부터 떨어진 채, 그것의 바깥에 서 있는 바이다. (따라서) 어찌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르거나 지어 붙인) 이름과 글자에 의해 (그) 모습이 표현될 수 있겠는가? 어찌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마음과 지혜로써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앞 (1장의) 문장은 일컬었다. “(일부러 일삼아 지어 부르거나 지어 붙일 이름이 ‘없는’ ‘도道’는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르거나 지어 붙인 이름이 ‘있는’) 천지의 시작이다.” 또한, (25장의 문장은) 일컬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겠다.”
樸雖小, 天下不敢臣.
순박하고 소박한 바(인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한데, (따라서) 천하가 감히 신하로 삼아 부리지 못한다.
樸, 淳素也. 小, 微妙也. 言淳樸之道, 其自細微, 而能開化陰陽, 享毒群品. 百姓日用. 而不知. 亦未敢自臣, 我有道者也. 又云, 物無貴賤. 道在則尊. 故巢父, 許由, 王倪, 齧缺, 此之數子, 皆以窮爲匹夫, 而天子不得臣, 諸侯不得友, 卽其事也.
“박樸”은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순박하고 소박하다는 말이다. “소小”는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하다는 말이다. 이른바,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소박하고) 순박한 “도道”는 그 일부러 일삼는 바가 아주 어슴푸레하지만, 음陰과 양陽으로 펼쳐지고 변화되면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도道”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도道”는) “감히” 일부러 일삼아 “신하”로 삼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이미) “도道”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다른 해석은 이렇다. “사물은 (본래) 귀함이나 천함을 가지는 바가 없다. 도道가 자리하게 되면서, (이내 귀한 바로 받들어) 높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부巢父, 허유許由, 왕예王倪, 설결齧缺,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보통 사람들처럼 궁색했지만, 천자天子가 (‘감히’ 일부러 일삼아) ‘신하’로 삼아 부리지 못했으며, 여러 제후들이 (‘감히’ 일부러 일삼아) 벗으로 삼아 어우러지지 못했는데, 이른바, (이것이) 그 사례이다.”
第二, 擧守道而能降瑞.
두 번째 문단은 설명한다. “도道를 지키라. 따라서 상스러움을 내리게 할 수 있다.”
王侯若能守, 萬物將自貧.
군주가 만약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끝점에 다다름이 지극한 도道를 닦아서) 지킬 수 있으면, 천하의 사람들이 장차 스스로 (찾아와 그러한 군주를) 손님처럼 따르게 될 것이다.
言君主, 若能修守至道, 殊方異城自來貧伏. 而歸化也.
(이 문장이 뜻하는 것은) 이른바, 군주가 만약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끝점에 다다름이) 지극한 도道를 닦아서 “지킬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 “손님”처럼 자신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군자가 만약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의 끝점에 다다름이 지극한 도道를 닦아서 “지킬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 살던 백성이 스스로) 되돌아와 (그러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교화되게 된다는 것이다.
天地相合, 以降甘露.
(군주가 만약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이 끝점에 다다름이 지극한 도道를 닦아서 지킬 수 있으면) 천지가 (그러한 군주와) 더불어 어우러지게 되고, 따라서 (하늘에서) 단 이슬이 내리게 될 것이다.
夫與天地, 合其德, 陰陽, 合其序者. 故致四時玉燭. 七曜無衍, 靈瑞嘉祥芝英, 甘露. 國無, 虛, 用. 不? 亦宜乎?
(“천지상합天地相合”이란) 이른바 “천지”와 더불어 하게 된다는 말로서, 그 덕스러움德과 (더불어) “어우러지게 된다”는 뜻이자, 음양陰陽과 더불어 하게 된다는 말로서, 그 질서로움과 (더불어) “아우러지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비유컨대) 사계절이 옥玉과 촛불처럼 또렷하고 뚜렷해지게 되며, (해日·달月·나무木·불火·흙土·쇠金·물水) 일곱 개 별자리의 움직임이 흐트러지는 바가 없게 되고, 신령스럽고 상스러우며 아름답고 길한 지초芝草가 꽃을 피우게 되며, (하늘에서) “단 이슬이 내리게 됨”에 이르게 된다. (요컨대) 나라가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가짐이) 없게 되고, (따라서 백성이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텅 비우게 되며, (따라서 나라가 저절로) 일삼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人莫之令而自均.
사람들이 군주가 명령한 바가 없음에도 저절로 평안해지게 된다.
均, 平也. 莫, 無也. 德合二儀, 明齊三景, 百姓, 無待敎令, 而自太平. 道力, 不可思議. 守之, 致有此益也.
“균均”은 평안하다는 말이다. “막莫”은 (무엇을 가짐이) 없다는 말이다. (이른바, 군주의) 덕스러움德이 (일부러 일삼음이 ‘없는’) 음陰·양陽(의 질서로움)과 “어우러지게 되고”, (일부러 일삼음이 ‘없음’에 대한 지혜로움의) 밝기가 해·달·별과 나란해지게 되면, 백성이 (군주의 일부러 일삼은) 교화나 명령에 의지하는 바가 없음에도 “저절로” 크게 평안해지게 된다. (이렇듯) “도道”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이렇듯, 군주가) “도道”를 (닦아서) “지키면”, 그러한 이로움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가지게 된다.
第三, 始制下廣, 其制用.
세 번째 문단(이 의미하는 것)은 ‘처음의 (이름) 지음’이 (하늘) 아래에 펼쳐지게 되자, 그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음’이 일삼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始制有名, 名亦旣有.
처음 지어 부른 이름을 가지게 되자, (그러한) 이름이 또한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
因無名以立有名, 寄有名以明無名, 方欲引導群迷, 令其悟解也.
(이 문장과 다음 문장에서 노자가) ‘무명無名’을 말미암아 ‘유명有名’을 세우고, ‘유명有名’을 의지해서 ‘무명無名’을 드러낸 까닭은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미혹됨을 (밝음으로) 이끌어,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夫亦將知止.
따라서 또한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름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
道, 無稱謂. 降迹. 立名. 意在引物向方. 歸根, 反本. 旣知奇言詮理, 應須止名求實. 不可滯執筌蹄, 失於魚兎.
“도道”는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르거나 일컬을 수 없다. (그런데 “도道”는) ‘흔적(迹; 일삼음)’을 펼친다. (따라서 노자는 그 ‘흔적’을 말미암아 그) “이름”을 세웠다. (그런데 그렇게 한 노자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게 하는 데 있다. (요컨대, 노자가 “도道”라는 “이름”을 세운 까닭은 세상 사람들을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슴푸레한 만물의) 근본(根; 性)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렴풋한 세상의) 근원(本; 理)을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언어를 활용하고, 논리를 전개할 줄 안다면,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름을 “멈춘 채”,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슴푸레하고 어렴풋한) 실상(實; 性·理)을 구함과 어우러져야 한다. (왜냐하면, 비유컨대) 통발이나 올무를 집착하다, 물고기나 토끼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知止不殆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름을) 멈출 줄 알게 되면, 위태롭지 않게 된다.
筌蹄旣忘, 妙理斯得. 止名, 會實.
(비유컨대) 통발과 올무가 이른바 잃어버려지게 되면, (세상의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렴풋한 리(理; 本), 그것이 얻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일부러 일삼아) “이름” 지어 부름을 “멈추게 되면”, (본래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이 어슴푸레한 만물의) 실상(實; 性·根)과 어우러지게 된다.
第四, 譬道下將以結成.
네 번째 문단은 도道가 (하늘) 아래에 자리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로써, (이 장을) 끝맺는다.
譬道在天下, 猶川谷與江海
비유컨대, 도道가 천하에 자리하는 모습은 시내물과 계곡물이 강과 바다와 더불어 하는 모습과 같다.
江海, 善下. 爲百川之所共溱. 聖道, 虛容. 爲衆生之所歸往. 故下文云,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也.
“강과 바다”는 “아래”가 되기를 잘한다. (따라서) 여러 “시내물”이 더불어 모여드는 바가 된다. 성스러운 “도道”는 (일부러 일삼음이 ‘있음’을) 텅 비운 채,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만물까지) 품어 앉는다. (따라서 일부러 일삼음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되돌아오거나 찾아드는 바가 된다. 따라서 다음 (66장)의 문장은 일컫는다. “강과 바다가 여러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아래가 되기를 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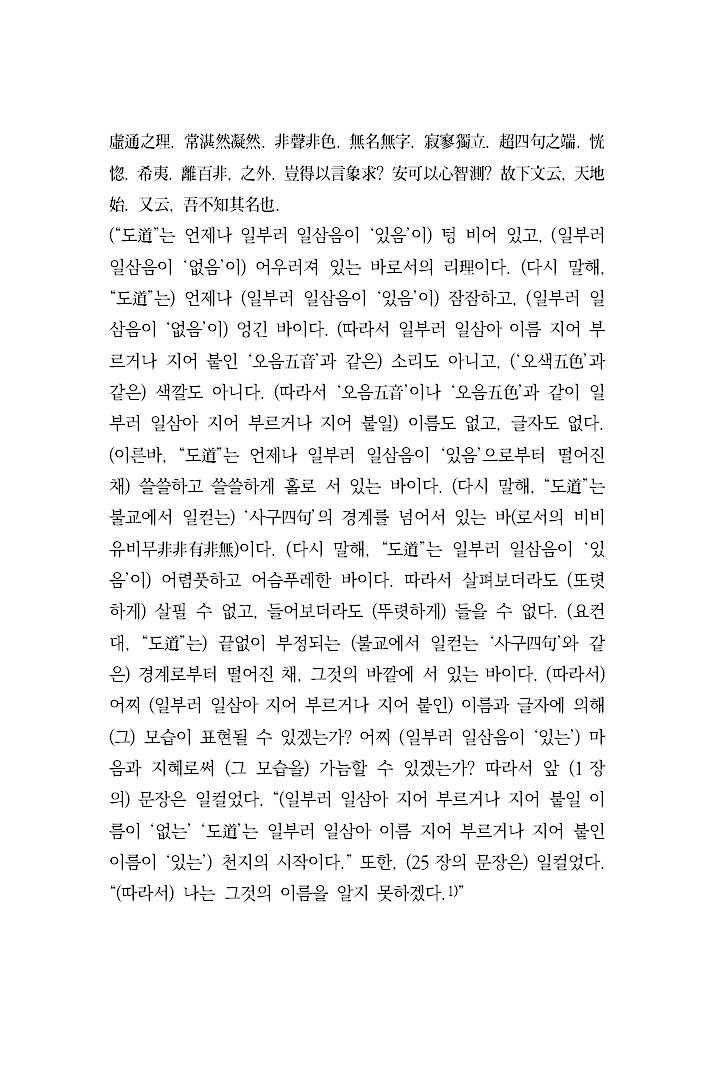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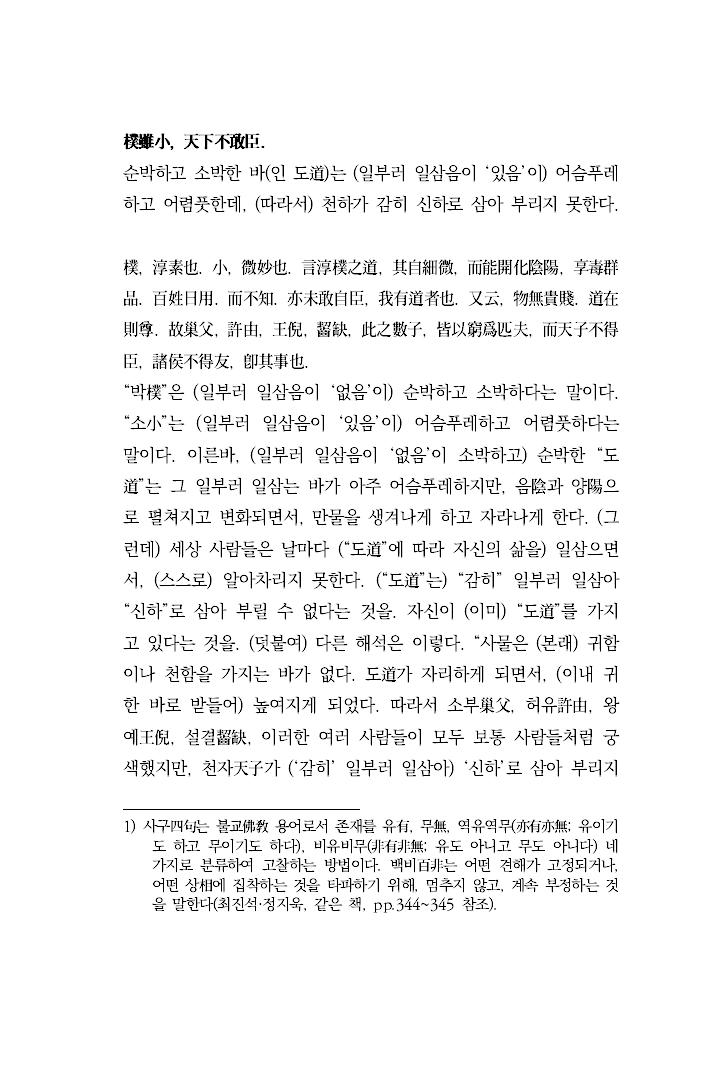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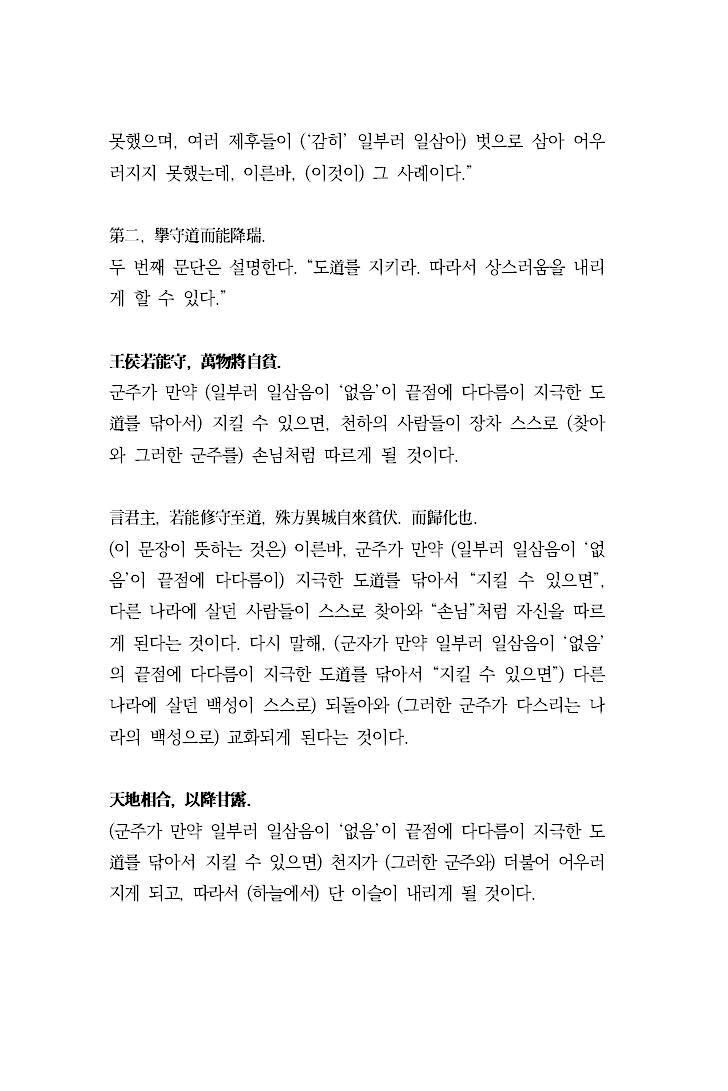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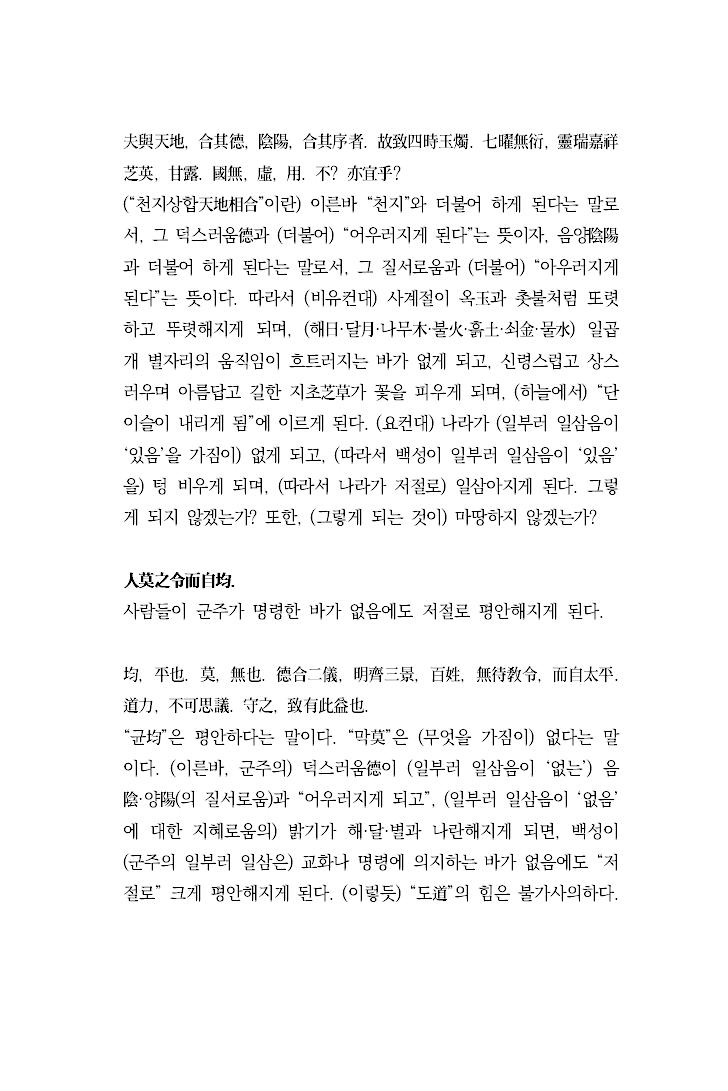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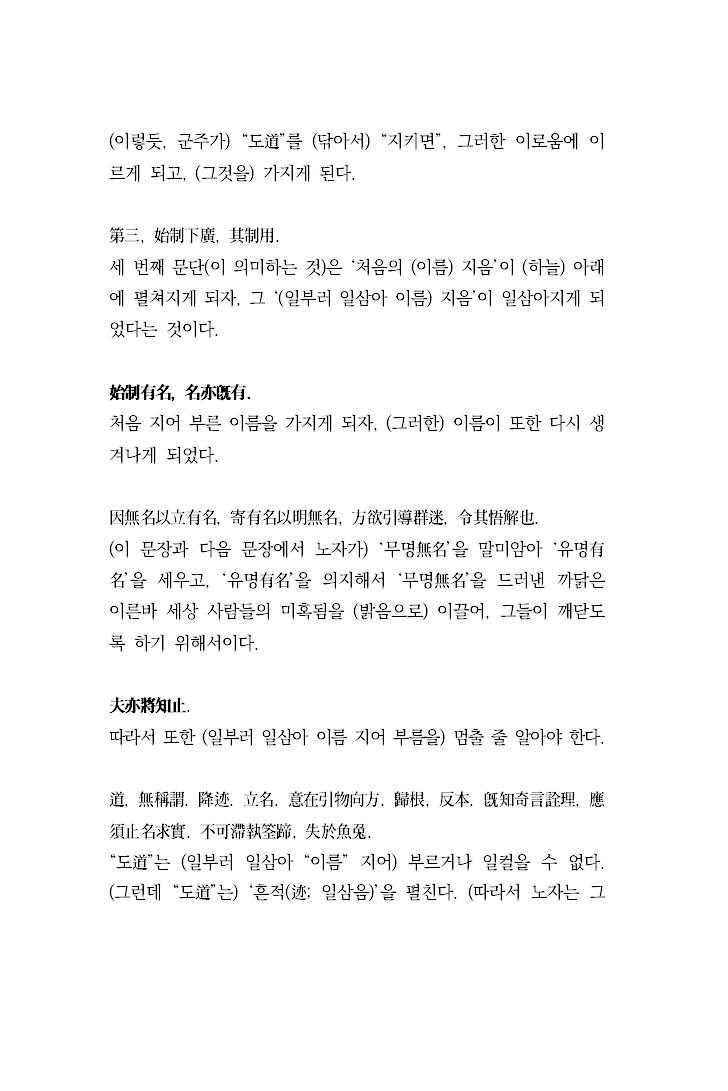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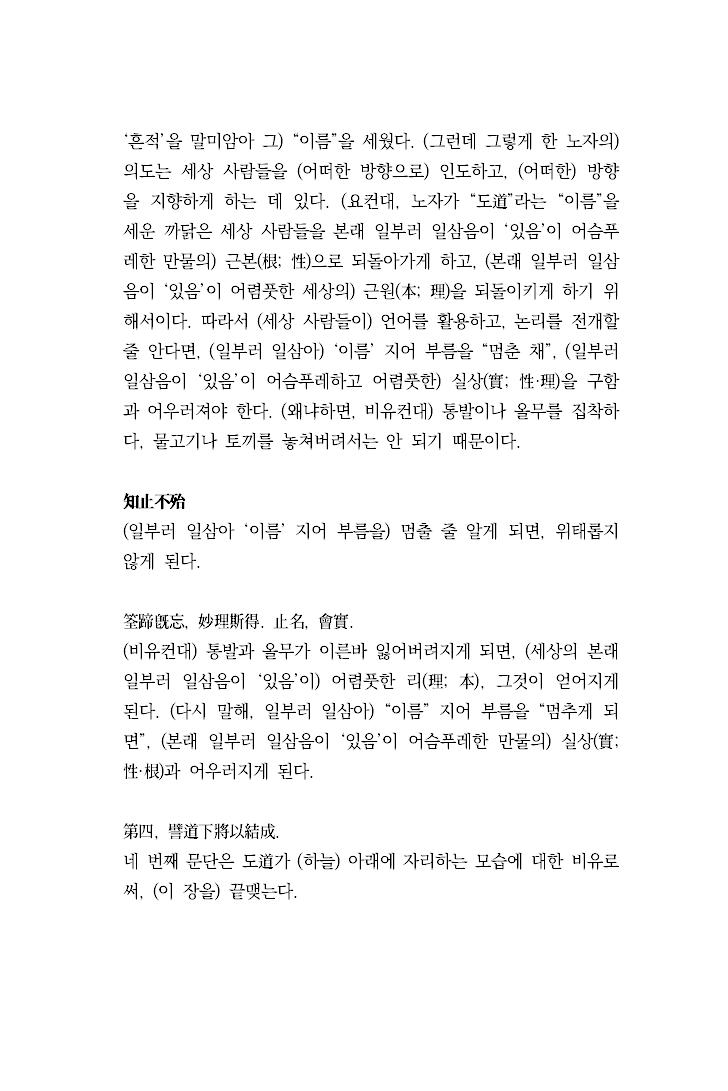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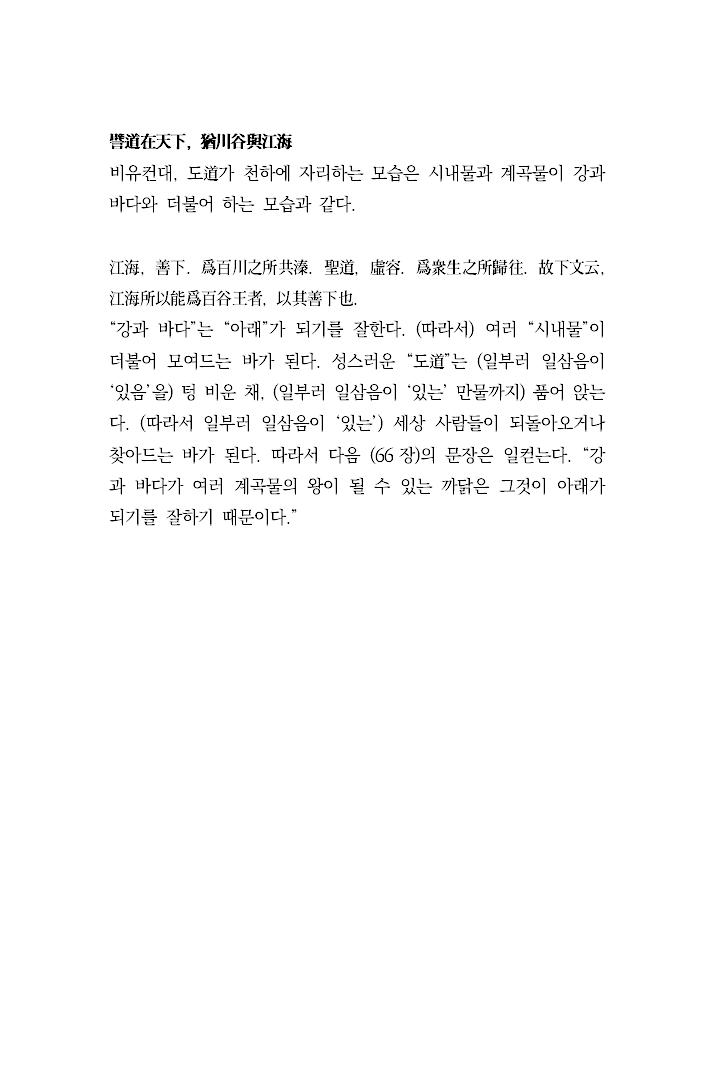
'자실산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현영의 노자의소 : 35. 대상大象 (1) | 2023.08.07 |
|---|---|
| 성현영의 노자의소 : 34. 대도大道 (1) | 2023.07.20 |
| 성현영의 노자의소 : 31. 가병佳兵 (0) | 2023.07.18 |
| 성현영의 노자의소 : 29. 장욕將欲 (1) | 2023.07.10 |
| 성현영의 노자의소 : 28. 지웅知雄 (1) | 2023.07.05 |




